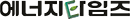빠르면 오는 6월부터 ‘그린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녹색소비생활을 유도하겠다며 ‘그린카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제조·유통 분야의 참여기업, 카드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그린카드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오는 6월부터 BC·KB카드를 통해 발급을 시작하고 관련 인프라가 확충 되는대로 전국 모든 카드사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 2015년까지 카드발급 500만장, 참여기업은 약 400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500만장은 현재 카드사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중 베스트상품으로 손꼽히는 규모다.
환경부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와 녹색매장, 탄소라벨링제 등을 확대 시행하고 그린카드와 연계할 생각이다.
하지만 탄소포인트제는 지난해 기준 전국 약 170만 가구만 동참하고 있다. 탄소라벨링제도 3월 현재 71개 기업, 325개 제품만이 인증을 받아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그린카드 도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자칫 녹색생활 실천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겨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특정 기업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린카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러나 그린카드도 상품이 결합된 또 다른 형태의 신용카드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신규카드 발급으로 인해 카드론 등 손쉬운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가계부채 부실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특정혜택이 결합된 또 하나의 ‘신용카드’가 탄생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그린카드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기보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등 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린카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시장영향평가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실한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소비’가 ‘녹색’보다 우선돼 제도가 가진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