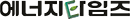지식경제위원회 국감도 부실하기 마찬가지라는 안타까운 지적이다. 이미 감사원이나 언론에서 지적한 것들을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들고 나오는가 하면, 전 정권서부터 이어져온 사업의 성과를 놓고 여야가 서로 자기 몫이라고 언쟁을 벌이는 모습은 피감기관이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0년 간 국감장에 나왔다는 한 피감기관 공무원은 “예전에는 의원들의 지적이 날카로와 국감장에 들어서기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다”며 “솔직히 피감기관으로서 홀가분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감이 부실한 이유로 위원들이 단기간 내에 많은 기관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과 산업의 고도화로 전문 지식을 쫓아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지경위는 휴일과 자료수집일을 뺀 순수 12일 동안 4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하루에 4개 기관을 상대하는 꼴로, 지난 10월 7일에는 무려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무리한 일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감장에 가면 위원들이 피감기관에서 사용하고 행하는 용어, 사업, 제도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워낙 기술발전이 빠르고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쏟아지다 보니 여러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위원들로서는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주요 기관에만 질의가 집중되고 나머지는 통과의례가 돼버리고 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감을 분기별로 나누거나 상시 운영체제로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를 분과별로 나누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들의 철저한 준비자세이다.
피감기관장들이 국감을 무시하는 태도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태도를 탓하기 전에 누가 자초한 일인지 위원들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